계속 지켜보기만 하다가 그냥 한마디만 해야 할것같아서 끄적여 본다. 조금 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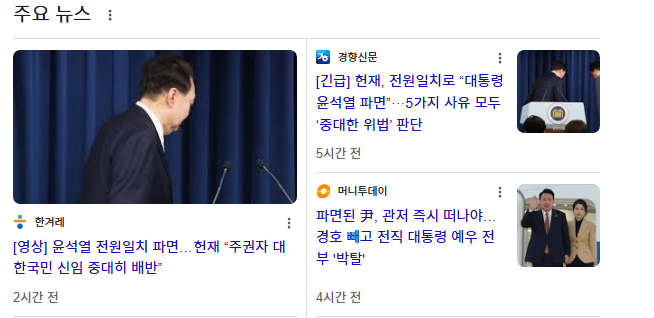
스텐포드 엑스페리먼트 (The Stanford Prison Experiment)
1971년에 있었던 일종의 심리 실험이다. 공식적인 명칭은 스텐포드 감옥실험(stanford prison experiment)인데, 이 실험은 스텐포드 대학에서 71년 8월 14일 부터 20일까지 있었던 실험이며, 제목에서 예상하듯이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을 샘플로 뽑아서, 무작위로 간수와 죄수라는 역할을 부여하고 이 과정에서 어떤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려고 했던 지극히 단순한 실험이었다. 일정액의 보수를 받고(일당 15달러에 2주일이었다고 한다.71년 기준..) 실험에 참가한 참여자들은 건강하고 중산층의 대학생들 24명이며 이들은 다 건강하고 중산층에 대학생 다 같은 수준의 인물들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들중에 간수와 죄수를 무작위로 뽑았다. 그리고 2주동안 실험이 진행돼었다.
어찌 보면 재밌는 실험이다. 마치 현재 리얼리티 프로그램처럼 말이다.
그러나 실험은 비극으로 끝났다. 폭동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고 학대당하고 참가자들의 멘탈이 무너지고 신경쇠약까지 가게된다. 실험은 2주를 채우지 못하고 끝을 냈다. 실험을 책임지던 짐바르도 교수도 이를 진압하고 막는 과정에서 실험 담당자의 권위를 내세우며 외려 "학자"보다는 "교도소장"처럼 되어가고 있었다고 한다. 결국 이 실험은 실험을 밖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에 의해서 제지됐다고 한다. 즉, 모두가 이 틀 속에 녹아들었던것이다.
* 여담이지만, 처음에 이 사건을 접했을때, 나는 애초부터 실험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유는 이들이 아마존 원주민 같은 원주민이 아닌이상 어떤 역할을 부여받으면, 그 역할에 대한 학습효과가 있고 그 학습효과는 본능적으로 어떤 "코스프레 ,그러니까 어떤 역할극"을 하게 한다는것이다. 이것은 배운 사람일수록 더 한데, 이들이 평범한 사람이라고는 해도, 실은 그 시대 즉, 70년대의 대학생들이었다. 이들은 이미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죄수와 간수라는 캐릭터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해가 있다는것은 자기 자신이 실제 간수와 죄수가 아니기 때문에 대개 미디어를 통해 접한 이미지와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면은 이런 실험에 있어서 그 순수성을 외려 방해하고 시키지 않은 역할극을 하려는 의도가 실험 자체를 왜곡 시킬 수 있다고 봤기때문에 실험이 잘못돼었다고 보는것이다.
나무위키를 보니까, 이후의 이야기 즉 뒷이야기를 보니 "조작설"등의 이야기가 나오는것같다. .이것은 아마도 "조작"이라기 보다 바로 그런 역할극적 요소가 인위적으로 작동되었슴을 뒷받침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이야기는 수 차례 걸쳐 영화화 되기도 하였다.

* 이 작품 말고도 몇 차례 더 영화화 되었고 최근까지도 영화화 된것을 본적이 있는데, 윗 작품이 가장 작품성을 인정 받은 작품중 하나..
어쨌건, 이 문제는 이후에 이라크 전쟁당시 아부그라이브 형무소사건에서 다시 회자 되는데, "평소에 착한 소녀"였던 당시 이라크 파병 여군이 감옥안에서 이라크 병사들을 아무 죄책감없이 학대하고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다시 회자된다. 밀폐되고 폐쇄된 어떤 환경에 지배받아서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야만적인 행동을 하고 있슴을 자신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들....

* 출처 : https://en.wikipedia.org/wiki/Abu_Ghraib_torture_and_prisoner_abuse
아무 일이 없었으니 괜찮다..?
윗 실험에서 간수와 죄수의 사례처럼, 자신의 역할과 처한 위치 곧 직분... 위 경우처럼 본래 제 역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부여받은 인물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존의 학습효과가 그들 자신을 그 틀 안에 녹아 버리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미디어를 접함에 있어 점차 그 미디어가 자신과 일체가 되어버리는 매클루언이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을 생각나게 하는데..
"계엄령의 선포"라는 의미를 생각해 본다. 선포를 한 사람이 단순히 "깜짝쇼"처럼 이 일을 벌였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그러나 드러난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재차 여러 차례 시도한게 드러나고 있었다. 만약에 말 그대로 그냥 그대로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게 왜 위험한지를 바로 저 실험을 예를 들기위해 간략하게 스텐포드 익스페리먼트 실험을 소개한것인데, 일반 군인과 "계엄군"이라는 위치는 전혀 다르다 이 순간 그들은 마치 죄수와 간수의 역할을 부여받은 "간수"같은 상황이 되어버린다. 이 과정에서 만약에 만의 하나 불상사가 벌어지고.. (스텐포드 익스페리먼트처럼..) ,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다. 계엄군의 총을 막고 뺏을려고 했던 여성 앵커의 모습등이라든가, 계엄군에게 대항하려고 했던 시민들의 초기의 통제 받지 못한 흐름들..... 이런것들사이에서 만일 불상사가 터졌다면 어찌 되었을 것인가.. ? 과연 이 부분을 컨트롤을 하는 당사자가 바로 이런 상황을 과연 유연하게 컨트롤 할 수 있었을까..?
군 집단의 특성은 어떤 일이 일단 벌어지면 "강공"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짧게나마라도 군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아는 논리다. 뭐 굳이 군대까지 가지 않더라도 어떠한 상황에서 단순한 장난인데 이 장난이 어떤 주목을 끌거나 묘한 어떤 상태를 만들어 내면 본인의 의도완 상관없이 큰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경우도 이런 경우와 마찬가지다.. 이를테면 내가 그냥 길거리를 가다가 당하는 "시비"와 어떤 직분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받게 되는 "시비"는 경우에 따라 무시하고 넘어가도 될걸 무시하지 못하고 그 직분때문에라도 어떤"스탠스"를 취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는것이다.
마찬가지다. 계엄군이라는 직분이 일반 군인과 다른것은 이때의 군인은 말그대로 "비상시 어떤 행동을 피치 못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 이 당시에 컨트롤이 안되거나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사건은 최초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게 된다.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아무일 없었지 않느냐?"라고 그냥 넘어가는 의미로 본다면 이건 "무식도 이런 무식함이 없다." 일반인들과는 달리 권력을 사용할때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쪽은 전혀 그런것을 고려하지도 않았고 앞서 언급했듯이 (언제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권력을 자판기 커피 뽑듯이 써 먹었다는것이 참 한심하다는것이다.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큰 사건을 일으킨 것인데 그 이후에 뻔뻔함으로 일관하는 모습에서 "군자나 식자"라고 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길거리로 나가 추운 바람 맞았던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으로서 "설득" 과 "몸낮춤"등을 왜 생각해 보지 못했을까..?그것이 그렇게 자존심이 상했을까 아니면 몰랐을까..? 몰랐다면 "통치자로서 무지했던 죄". 알았다면 "국민( 탄핵 인용문의 대한국민이란 표현이 맞겠구나..)을 낮게 보았던 오만했던 죄". 이것만으로도 벌써 그는 "대한국민"으로부터 "파면" 당했다.
헌재는 거기에 서명만 해 준것뿐이다.

* 1차 포스팅 이후 사진등을 추가 첨부위해 수정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 여전히 그는 공식적으로 어떤 "대국민" 차원에서의 사과나 그로 인해 빚어진 수 많은 갈등거리들에 대해 아무 입장도 표명하고있지 않다.
사진 속 그는 여전히 웃고있다.
스탠포드 감옥실험
https://ko.wikipedia.org/wiki/스탠퍼드_감옥_실험
https://namu.wiki/w/스탠퍼드%20교도소%20실험
실험.Das Experiment (2001)
https://www.imdb.com/title/tt0250258/?ref_=tt_mlt_t_1
아부그라이브 형무소 사건
https://en.wikipedia.org/wiki/Abu_Ghraib_torture_and_prisoner_abuse (영문위키)
https://ko.wikipedia.org/wiki/아부그라이브_교도소_가혹행위_사건